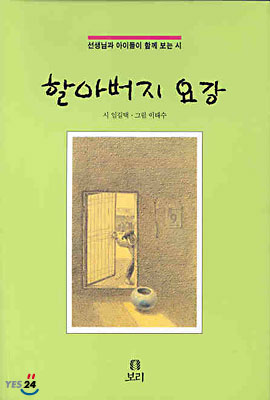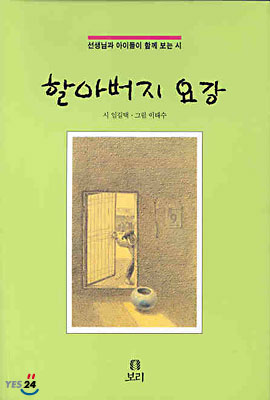초등학교 교사가 바라본 아이들의 삶, 그 가족의 삶, 아이들이 사는 마을의 모습을 수필처럼 잔잔하게 그려낸 시모음이다. 아이들의 삶과 아이들이 몸 담고 있는 가정과 마을, 자연을 사랑한 시인의 자세가 아름답다. 편안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다. 정성들여 그린 이태수의 세밀화가 시를 든든하게 받쳐준다.
 미디어 서평
미디어 서평
어린아이 마음처럼 소박하고 참한 시어들 요란한 말치장 꾸짖어
동요의 시대는 떠났다. 지금 무심코 어른들 입에 올려지는 그 옛날의 창작 동요는 사실 일본 곡조를 닮은 것이다. 식민지 백성의 설움을 달래주던 그 시절 그 노래를 요즘 아이들은 청승맞다며 가까이하지 않는다.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일이다. 그러나 동시는 남아 있다. 책으로 출판되어 읽히는 양으로 치자면 결코 동화에 견줄 바가 아니지만, 수많은 시인들이 꾸준히 동시를 지어 발표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동시의 비중은 아주 크다. 그런데 교과서 동시야말로 문제의 근원이다. 한 편의 시로서가 아니라 말로써 퍼즐 놀이를 하기에 더 좋은 것들을 싣고 있으니 애초부터 문학작품의 감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나 붙들고 한번 동시를 지어보라고 해보자. '무지개, 풀잎, 이슬, 햇살, 구름, 씨앗…' 따위 말들을 조합하지 않을 이가 있을까. 아이들의 실제 삶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이상한 관습에 매달려 상투어를 남발하는 시인들에게 이 그릇된 통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에 세상을 뜬 임길택 시인은 달랐다. 그는 시집 『탄광마을 아이들』과 동화집 『산골마을 아이들』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가 탄광마을에서 농촌으로 학교를 옮겨가서 펴낸 시집 『할아버지 요강』(이태수 그림, 보리, 1995) 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농사일.자연 등과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정직한 눈으로 응축해 보여준다. "서리 온 아침/당번을 하던 영미//걸레를 빠느라/붉어진 손이/그토록 조그마한 줄을/나는 미처 몰랐다. (「영미의 손」전문) " 이런 시를 읽노라면, 내가 아는 그 착한 시인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진다.
"아침마다/할아버지 요강은 내 차지다. //(…) 어머니가 비우기 귀찮아하는/할아버지 요강을/아침마다 두엄더미에/ 내가 비운다. /붉어진 오줌을 쏟으며/침 한 번 퉤 뱉는다. (「할아버지 요강」부분) " 이런 시를 읽노라면, 시인의 몸 안으로 들어온 어린이 마음이 그대로 느껴진다.
세상은 갈수록 요란하다. 알맹이보다는 빈 쭉정이가 더 화려한 체 한다. 세상이 외면하는 것 같아도, 침묵을 머금은 절제된 시, 어린이를 닮은 소박한 언어가 무척 그리운 시대다. 그러나 심지가 없는 시인들은 온갖 떠들썩한 말들로 치장을 해가며 아이들을 현혹한다. 아이들이 시다운 시와 가까이하고 살았으면 좋으련만…. <중앙일보 행복한 책읽기 01/4/21 원종찬 (아동문학평론가)>
순수한 농심으로 담은 농천삶의 진솔한 향기
단 한 줄의 문장으로도 풍경이나 사물이나 인간 혹은 인생의 정수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시이다. 그러나 이제, 누가 시를 읽는가. 시는 점점 독자들을 잃어가고 있다. 동시도 마찬가지다. 어린이 문학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요즘에도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것이 동시다. 아이들은 동시를 어떻게 이해할까?
유치원 교육 탓인지 아이들은 동시 한 번 써보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짧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쉽다는 느낌을 주는 모양이다. 아이들은 시인이라는 말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른들이 사용하는 일상언어의 문법을 아랑곳 하지 않고, 저희들이 느끼는대로 언어화해 놓은 글들은 종종 ‘시’가 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초등학교 교과서 동시에 익숙해지면서부터 아이들은 시를 잃어버린다. ‘시시한’ 교과서 동시들이 아이들의 ‘시’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동시라면 어른이건 아이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버렸건만 아직도 그 위기를 말하는 이는 별로 없다. 임길택은 그 와중에 조용한 목소리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보는 시’를 남기고 떠났다. 그의 시들을 읽고 있노라면 눈에 잡힐 듯이 떠오른다. 노년기 지형 덕분에 한없이 둥글고 정겨운 우리 산천이. 그 어느 산자락 마을에 오두마니 살고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삶이. 70~80년대를 지나오는 우리 아동문학에 가장 흔한 것이 농촌 혹은 가난을 말하는 작품들이다. 그러나 농촌 사람들의 억울함, 도시 사람들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작품은 많아도 실제로 농촌을 담고 있는 작품은 별로 없다. ‘할아버지 요강’(1996년 간)이 빛나는 것은 ‘농촌에서 아껴 쓰자 말하는 것은 웃을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시인이 ‘가난 해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농촌 사람들의 속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흙먼지 뒤집어쓰고 다니’면서 ‘길 가기 힘든 이들 모두 태우고 언덕길을 함께 오르’는 ‘완행 버스 같은 사람이 되고만 싶’은 마음으로 쓴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우리들 가슴을 순하디 순하게 만들어 주는 걸까. 책장을 덮고 나면 ‘향기’가 전해져 온다. 그 향기는 얼마간은, 흑과 백만으로도 다양한 톤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이태수의 그림들 덕분이다. 그리고 또 그 그림들이 시의 이미지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계산한 편집자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다. <조선일보 00/10/28 최윤정(아동문학평론가)>